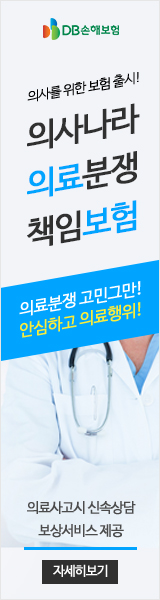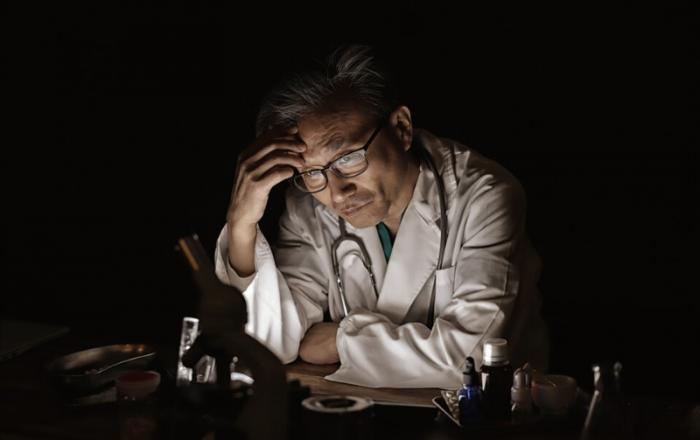제조사, “과학적 정의 맞지 않아” 소송 제기했지만 1·2심 모두 기각
“정책 목적·전문가 의견 반영해 분류 가능”… 과학적 정의 일치 필요 없어
급여 상한금액 결정도 위법성 없어… “비용효과·공공성 종합 판단” 강조
히알루론산을 주성분으로 한 드레싱 제품의 건강보험 급여 분류와 상한금액 결정에 대해, 법원이 보건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제조사가 건강보험 기준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1심과 항소심 모두에서 보건복지부의 행정 판단을 존중하는 결론이 내려졌다.

이번 소송은 한 드레싱 제조업체가 자사 제품의 건강보험 분류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핵심 쟁점은 해당 제품이 급여 대상으로 인정받는 과정에서, 과연 보건복지부가 어느 정도 재량권을 가질 수 있는지였다. 제조사는 자사 제품이 하이드로겔 기준에 맞지 않는데도 이 분류로 지정됐고, 상한금액 역시 제조원가에 못 미친다며 형평성을 문제 삼았다.
해당 드레싱 제품은 처음엔 비급여 항목으로 유통됐으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2021년 4월부터 급여 대상으로 전환됐다. 당시 전문평가위원회는 제품을 하이드로겔 드레싱류로 평가했고, 규격별 상한금액을 각각 2,960원과 4,980원으로 정했다.
이에 제조사는 제품이 콜라겐을 포함한 생물학적 드레싱에 해당하며, 하이드로겔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비슷한 성분의 다른 회사 제품은 별도 분류를 받았다는 점도 형평성 위반 근거로 내세웠다.
보건복지부는 히알루론산나트륨이 주성분이고, 수분 공급 등 하이드로겔의 핵심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을 들어 해당 분류가 타당하다고 반박했다. 급여 기준 역시 임상적 유용성, 정책 필요성, 전문가 자문 등 복수의 기준을 종합해 정해졌다는 입장이다.
1심 법원은 건강보험 제도 특성상 한정된 재원 내에서 비용효과성, 임상효과, 공공성 등이 모두 고려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드레싱 제품의 주된 기능이 수분 공급이며, 콜라겐 함유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생물학적 드레싱으로 분류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상한금액 산정 역시 정책 목적과 재정 상황이 반영된 결과로, 제조원가와 일치하지 않는 점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제조사는 항소심에서 과학적 정의 미적용, 절차 미비, 형평성 문제를 다시 제기했지만,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급여 분류 기준이 반드시 과학적 정의와 일치해야 할 필요는 없고, 정책적 필요성과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결정했다면 행정 재량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제품의 기능과 성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점, 비교 제품과의 차이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의사나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하준 다른기사보기